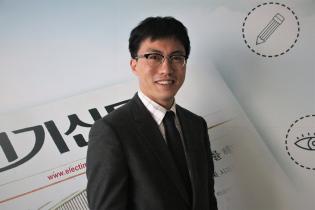
대한민국이 ‘트램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노면전차라는 이름의 트램은 국내에서는 몇십 년 동안 자취를 감췄으나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에서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트램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열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으나 유럽에서는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유럽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한 번 타보고픈 마음이 들어 그 자체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에서 트램 노선은 차선과 평행선으로 운영한다. 열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는 일반 자동차들이 트램 노선 위에서 운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혹여라도 트램과 자동차가 부딪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지만 유럽의 교통 법규에 따르면 이 같은 운전 방식은 합법이다.
하지만 2015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그 우려를 현실로 목격했다. 트램과 중형 벤츠 차량이 충돌해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한 모습을 직접 본 것이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벤츠 차량이 반파됐고 트램 승객들이 중간에 내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트램 공화국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안전이 제1의 원칙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운전자는 트램에 익숙하지 않다. 3호선과 4호선이 각각 지나는 동호대교와 동작대교는 차량과 지하철이 같은 눈높이에서 이동하지만 철저히 분리돼있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하지만 접해보지 못한 트램이라는 거대한 이동 수단이 차도를 점유하면서 이에 대한 적응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트램을 통해 새로운 교통 문화를 창달하고 관광 자원으로까지 승화하기 위해서는 단 한 건의 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두철미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도 트램이 달리던 시절이 있었다. 1899년 서울에 서대문-청량리 구간에 개통된 노선이 시초다. 하지만 그해 어린이가 전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분노한 시민들이 전차를 불태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1901년에도 선로에 누워 잠을 자던 두 남성이 막차로 복귀하던 전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시민들은 또 분노의 표시로 불을 질렀다.
이 같은 비극적인 트램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
